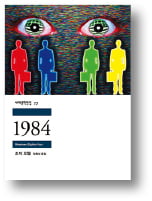
권력자는 통계를 미워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숫자들을 바꾸거나 숨기고 싶어 하죠. ‘정치적 글쓰기의 대가’ 조지 오웰(사진)이 1949년 발표한 소설 <1984>는 이런 권력의 욕망을 고스란히 고발합니다. 독재자가 제일 싫어할 법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빅 브러더’란 단어를 감시자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빅 브러더는 집, 거리마다 숨겨져 있는 ‘텔레스크린’ 기계로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자신의 사상을 선전해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CBDC를 통해 정부가 개인의 소비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며 ‘빅 브러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소설 속 국가의 감시와 형벌은 전쟁을 이유로 합리화됩니다. 1984년의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세 전체주의 국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를 계속 공격하고 헐뜯으며 전쟁을 일으켜요.
국민을 통제하는 데는 ‘역사’와 ‘언어’가 동원됩니다. 진리부는 뉴스와 역사 등 모든 정보를 당의 입맛에 맞게 주물러요. 신문이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건 수정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설 속 기사는 수시로 수정됩니다. 당의 슬로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소설 속에서 당은 각종 공식 용어를 정하고 그것들만 사용하도록 통제합니다. 이 용어를 수시로 없애거나 고쳐요. 공식 용어가 까다로워지면 공문서나 신문기사 등 각종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언어와 기록을 소수가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급 당원인 주인공은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여성 동료 줄리아와 몰래 연인이 돼 비밀리에 활동한다고 전해지는 반란 세력 ‘형제단’과 접촉합니다. 당의 모순을 고발하는 금서도 건네받습니다. 둘의 일탈은 곧 발각됩니다. 소설은 일말의 희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 갇히고 고문받습니다. 윈스턴은 고문을 피하려고 거짓 죄를 고백합니다. 줄리아를 배신한 뒤에야 풀려나요. 그는 사상의 자유를 포기하며 몸과 마음 모두 빅 브러더에게 굴복합니다. 빅 브러더를 사랑하기로 한 윈스턴을 보여주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투쟁은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 브러더를 사랑했다.”
윈스턴과 줄리아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소설의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1984>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고전으로 지금껏 읽히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