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와 관련 반도체 주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로드-도마의 ‘칼날 위를 걸어가는 성장 이론’(knife-edge theory)에 비유됐다. 특정국 경제가 마치 곡예사가 ‘황금률’(잠재 성장률=균형 성장률=실제 성장률)을 힘겹게 타며 성장하듯 신·구 기업가치 평가 잣대의 균형 위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작두를 타는 무속인이 균형을 잃으면 큰 상처를 입는다. 현재 AI와 관련 반도체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ER) 30배 내외로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고평가 국면이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주가비율(PSR), 무형자산 대비 주가비율(PPR) 등 새 잣대로 보면 미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해 현 평가를 납득할 수 있다.
닷컴 버블 당시 주도주 평균 PER은 50배에 달했다. PSR, PPR로 본 미래 잠재 가치도 낮아 고평가를 유지하지 못했다. AI 관련주는 다르다. 성장 사이클로 봐도 닷컴 버블 당시 주도주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였지만 AI 관련주는 이제 막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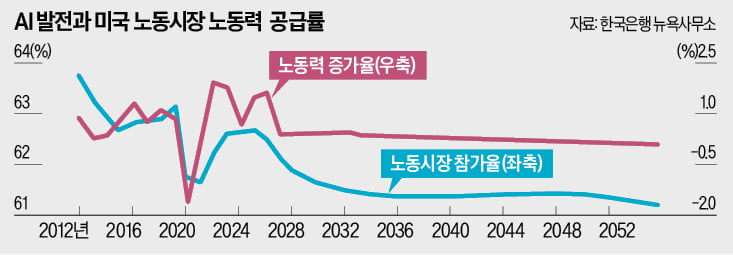
하지만 AI가 글로벌 소비자에게 파고들어 대중화하기까지 ‘불가피한 과도기 조치’라면 정반대 결과가 발생한다. VF를 택한 선도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선봉장인 젠슨 황과 올트먼은 천재로 평가받는다.
종전 국내 바이오 기업에선 VF를 현금화(cash out)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AI 거품론이 제기된 이후 다른 국가보다 국내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이런 낙인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다. 때맞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도 낙폭을 키웠다.
‘챗GPT’가 AI 대중화에 불을 붙인 지 불과 3년 남짓이다. 산업 발전 단계 관점에서 AI는 봄날에 엄동설한을 뚫고 돋은 ‘새싹’(green shoot)이다. 최근 거품론처럼 ‘곁가지’에 휘둘려 뼈대가 약해지면 ‘시든 잡초’(yellow weeds)가 된다. 반대로 정지작업을 잘해 뼈대가 튼튼해지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golden goals)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답은 AI와 관련 반도체 기업인, 투자자 그리고 정책 당국의 몫이다. 하루빨리 추가적인 친증시 정책을 내놓아야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향한 정부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