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실업률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경제가 좋아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실질 GDP 증가율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여건이 좋아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가 역대급 불황인 것만 보더라도 그건 아닌것 같죠.
그렇다면 경제도 안 좋고, 고용여건도 나쁜데 실업률은 도대체 왜 낮아지는 걸까요? 그건 실업률을 계산하는 통계의 착시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 9월 고용동향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는 2978만8000명인데, 그중 실업자 수가 63만5000명이니 실업률은 2.1%가 되는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실업률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실업자의 정의입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되는데요. 다시 말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즉 일자리를 찾기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집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일하기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흔히 말하는 ‘쉬었음 인구’가 이 사례에 포함됩니다. 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고, 따라서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청년, 그것도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 20대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15년 4.4%였지만 2025년(1~3분기 평균)은 7.2%까지 올라왔습니다. 20대 100명 중 7명은 자의든 타의든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합니다.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KDI에 따르면, 만약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등의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실업률은 현재보다 0.6%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장기 쉬었음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보다 면밀히 설계돼야 한다고 KDI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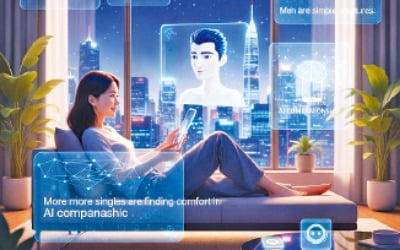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