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한 여자는 영리하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먹지도, 화장실에도 가지 않지만 그녀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서서히 심문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정장을 입을 것이다. 나와 사촌은 아버지가 남겨 준 낡은 정장을 입고 그녀와 마주한다. 그녀는 간악하다. 외계인의 수장은 역시 다르다. 도통 입을 열지 않으니 이제 전기 고문으로 안드로메다에서의 그녀의 서열을 파악해 보려 한다.


어딘가 낯이 익은 설정이 아닌지. 만약 2003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악명 높은 고문 장면을 떠올렸다면 정확히 맞다. 납치된 대기업의 회장, 강만식을 여성 CEO의 설정으로, 연인 납치범을 (사촌) 형제로 바꾼 설정을 제외한다면 위의 장면은 <지구를 지켜라!>의 고문 시퀀스를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한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부고니아>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약간의 설정을 제외하고 원작의 기본 줄거리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한다. 이야기는 한 공장에서 포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테디’(제시 플레먼스)가 좀 모자라는 그의 사촌, ‘돈’(에이든 델비스)과 함께 그가 일하는 기업의 대표, ‘미셸 퓔러’(엠마 스톤) 를 납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테디는 미셸이 안드로메다의 고위층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은 이들의 생체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가 미셸을 납치한 것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구하는 것과 함께 그녀와 함께 안드로메다로 가서 외계인들에게 지구를 해하지 말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지구를 구하고자 이 황당한 납치극을 벌인 것이다.

테디는 ‘지구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타적인 사람이지만 미셸을 고문하고 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극악무도함의 끝을 보인다. <지구를 지켜라!>의 ‘병구’(신하균) 가 그랬듯, 테디 역시 한없이 선한 직장 동료이자 아들이지만, 납치해 온 대상의 머리를 삭발하고, 전기 고문과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감행하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부고니아>에서 그리는 주인공 테디의 다중성,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련의 고문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이러한 ‘괴물’로 변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작품이 서로 다른 배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가령 병구는 국가 폭력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부정의 희생자다. <지구를 지켜라!>의 말미에서 납치된 ‘강사장’은 자신이 외계인임을 시인하며 왜 지구가 없어져야 하는지 상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인들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성을 키우기 시작하며 잔인한 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의 일장 연설은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세계적인 전쟁과 학살, 무엇보다 한국의 군사정권기가 빚어낸 갖가지 만행과 비극들과 중첩된다. 즉, 정권/정부의 갖가지 특혜를 입고 사장이 된 강사장은 지구인들(한국인들)의 부패와 권력 욕망에 대한 상징으로, 병구는 그 또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설의 상징이자 피해자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를 지켜라!>에서 한국 독재정권기에 대한 은유가 분명했다면 다른 문화권인 <부고니아>의 배경은 다르다. 테디 역시 지구인들이 폭력적으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국가) 권력의 피해자보다는 자본주의 논리와 계급적 순리의 피해자 혹은 낙오자에 가깝다. 그가 맞서 싸우고 있는 제약 회사, ‘옥솔리스’는 몇 차례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을 서슴지 않는 회사이고, 환경을 해하고 있으며 이제껏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돈으로 해결해 왔던 기업이다. 테디의 엄마도 그중 한 케이스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부고니아>는 미셸의 회사가 ‘악덕 기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들의 만행은 미국 사회, 특히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약회사들의 오랜 ‘관행’일 뿐, 미셸은 포브스와 타임지의 커버를 도배할 정도로 능력을 갖춘 여성 지도자이고, 그녀의 회사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단체인 것이다.

주인공, 즉 병구와 테디의 태생이 다른 만큼, 영화는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다. 궁극적으로 실제 외계인 지도자였던 강사장은 지구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으로, 미셸은 지구와 동물을 남겨두고 인간만 멸종시키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다시 말해 전자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은, 인간이 초래한,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폭력의 역사이고, 후자는 환경과 인권 침해의 원흉인 인간인 것이다.
거스 반 센트의 <싸이코> (1998), 스파이크 리의 <올드 보이> (2013)가 그러했듯, 거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감독들 역시 리메이크에 있어서 만큼은 혹평을 받았다. 전작의 유명세와 완성도가 높을수록 그것에 준하는 재해석과 변주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는 가히 최고의 리메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재해석이다. 한국사의 비극은 기업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독재자를 상징하는 구시대적 남성 사장은 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여성 지도자로 변모했다. 과연 22년이라는 작품 간의 시간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관객들의 호평만큼은 비슷한 기록 혹은 그 이상을 남길 것이 확실하다.
▶▶[관련 리뷰] 20년 전 쫄딱 망한 '지구를 지켜라'…베니스 삼킨 '부고니아' 미리보니 [여기는 베니스]
▶▶[관련 뉴스]원작에 모호함 한 스푼…“‘부고니아’는 인간 본성을 묻는 영화”[여기는 베니스]

김효정 영화평론가•아르떼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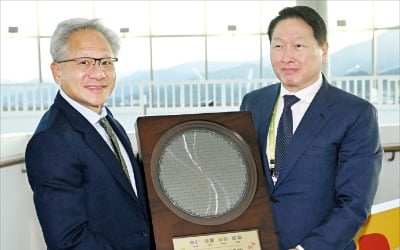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