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한국 면세점에서 오면 에스티로더의 ‘갈색 병’(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부터 ‘싹쓸이’ 해갔어요.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 면세점에서 사는 게 믿을 만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오면 갈색 병보다 K뷰티부터 찾네요."(국내 면세점 관계자)
'럭셔리 뷰티'의 대명사 미국 에스티로더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고가 전략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에스티로더와 '양대산맥'인 프랑스 로레알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다각화 여부가 두 회사의 희비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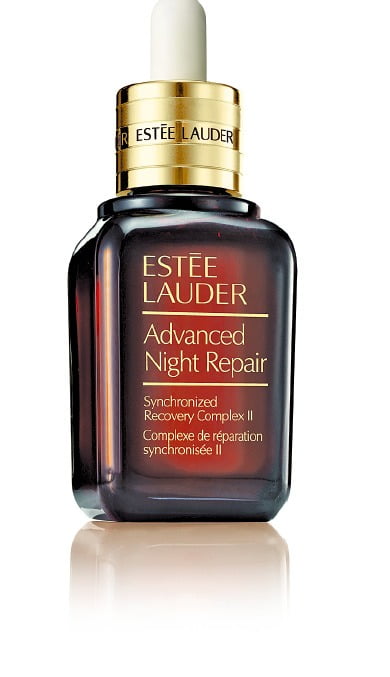
5일 에스티로더에 따르면 2025년 회계연도 2분기(10월~12월)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매출은 40억400만달러(약 5조 8700억원)로 1년 전보다 6.4% 줄었다. 영업손익은 5억7400만달러 흑자에서 5억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연간으로 봐도 에스티로더의 매출은 2022년 177억달러, 2023년 159억달러, 2024년 156억달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최근 실적 악화로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까지 발표했다.
반면 로레알은 지난해 매출(435억유로)과 영업이익(87억유로)이 나란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로레알 매출은 2022년 383억유로, 2023년 412억유로, 2024년 435억유로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로레알은 예측했다.
업계에선 두 회사가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든 원인을 세 가지로 꼽는다. 먼저 ‘제품 포트폴리오’이다. 에스티로더는 사명과 같은 에스티로더를 비롯해 라메르, 크리니크 등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가 전체 라인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크림 하나가 20만~3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브랜드가 대부분이다. 경기불황으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면 에스티로더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로레알은 럭셔리 제품군 외에 컨슈머(3CE·닥터지 등)와 더마뷰티(라로슈포제 등) 등도 갖추고 있다. 한쪽 매출이 줄어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다. 지난해 로레알의 컨슈머(5%)와 더마뷰티(9%)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럭셔리(4%)를 웃돌았다.

지역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에스티로더에 ‘양날의 검’이다. ‘인구 대국’ 중국은 2년 전만 해도 에스티로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시장이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현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에스티로더의 매출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가품이 적은 한국 면세점에서 제품을 ‘싹쓸이’ 해가는 것도 에스티로더의 주요 매출원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보기 힘들다.
반면 로레알은 지역별 매출이 고르게 분포돼있다. 지난해 로레알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32%), 북미(27%), 북아시아(24%),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9%), 남미(8%) 순이었다. 지난해 중국이 포함된 북아시아 매출이 전년보다 3.4% 감소했는데도 나머지 지역에서 선방하면서 전체 매출이 늘었다.
에스티로더는 신제품 출시·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아직 에스티로더가 과거 ‘갈색병 열풍’을 재현할 만한 동력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로레알은 최근 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기기 등 뷰티테크로도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지만, 에스티로더는 비교적 소극적”이라며 “에스티로더가 판도를 바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