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평론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준 푸시킨의 작품은 그 제목만으로도 감개무량한 설렘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존 크랑코(John Cranko)가 개척한 '드라마 발레'를 대표하는 20세기 히트작 <오네긴>의 낭만성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어떻게 그려낼지 더욱 기대되는 무대였다.

러시아어의 격을 높인 푸시킨의 작품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운문 소설 <에프게니 오네긴>은 작가가 1823년부터 1831년에 걸쳐 집필하고 1833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푸시킨은 프랑스 고전문학의 형식을 근간으로 러시아 특유의 정서와 향취를 담아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인정받았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상류 사회에서는 프랑스어가 선호되었고 러시아어는 자국민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던 언어였다.
푸시킨이 1833년 발표한 <에프게니 오네긴>은, 러시아적인 동시에 보편적 가치가 담긴 내용, 우아한 형식, 시대적 표현, 신랄한 풍자, 서정성, 현실주의와 신비주의 등이 조화를 이루며, 그 문학적 가치를 통해 러시아어의 격을 높이고 러시아 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운명, 사랑, 실존적 방황, 그리고 사랑의 비극
몰락한 댄디보이지만 여전히 허영과 욕망에 사로잡힌 오네긴, 독일 문학에 심취한 낭만주의 시인 렌스키, 사랑스러운 올가, 그리고 꿈 많은 이상주의자인 타티아나… <에프게니 오네긴>은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사랑과 방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한계를 그려내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세련된 귀족 청년 에프게니 오네긴, 그는 삶에 권태를 느끼고 영지를 물려받은 시골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순수하고 내성적인 타티아나, 사랑스런 그녀의 동생 올가, 그리고 올가의 약혼자이자 오네긴의 친구인 렌스키를 만난다.
타티아나는 오네긴에게 첫눈에 반해 열정적인 연서를 보내지만 오네긴은 냉담한 거절로 답변한다. 오네긴은 장난삼아 올가에게 집적거리며 친구 렌스키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한다. 오네긴과 렌스키는 결투로 맞서고 결국 렌스키는 죽음을 맞이한다.

권태와 죄책감으로 방황하던 오네긴은 몇 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복귀, 다시 타티아나를 만나지만 그녀는 이제 한 장군의 아내로, 품위 있고 성숙한 귀부인이 되어 있었다. 불현듯 타티아나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싶은 욕망을 느낀 오네긴은 그녀에게 간절히 구애하지만, 타티아나는 흔들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거절한다. 오네긴은 절망 속에 홀로 남는다.
푸시킨과 클래식 발레 안무
푸시킨의 문학 세계는 19세기부터 발레 안무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그들을 매혹시켰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카프카스의 포로(Le Prisonnier du Caucase)>와 <황금 물고기(Le Poisson d'or)>가, 1930년대에는 <바흐치사라이의 분수(La Fontaine de Bakhtchissaraï)>가 발레로 제작되었다. 파리 무대에서는 디아길레프(Diaghilev)의 발레 뤼쓰(les Ballets russes)가 <황금 수탉(Le Coq d'or)>을 선보였다. 푸시킨의 작품은 철저히 러시아적인 주제들로 가득하며, '드라마 발레'의 모태로서 발레 연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드라마 발레' 장르를 개척한 존 크랑코
존 크랑코(1927~1973)는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주는 기존 발레의 개념에서 벗어난, 춤 동작만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안무 영역을 개척한 연출가이다. 1950년대에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를 통해 푸시킨의 원작을 접한 그는 작품의 드라마적 요소에 크게 감명받아 3막 구성의 대본을 집필하고 안무에 착수한다.
발레 <오네긴>은 1965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초연을 거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1992년 갸르니에 극장에서 처음으로 발레 <오네긴>을 선보였으며, 이 작품은 1983년 <로미오와 줄리엣>, 2007년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이어 2009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존 크랑코의 안무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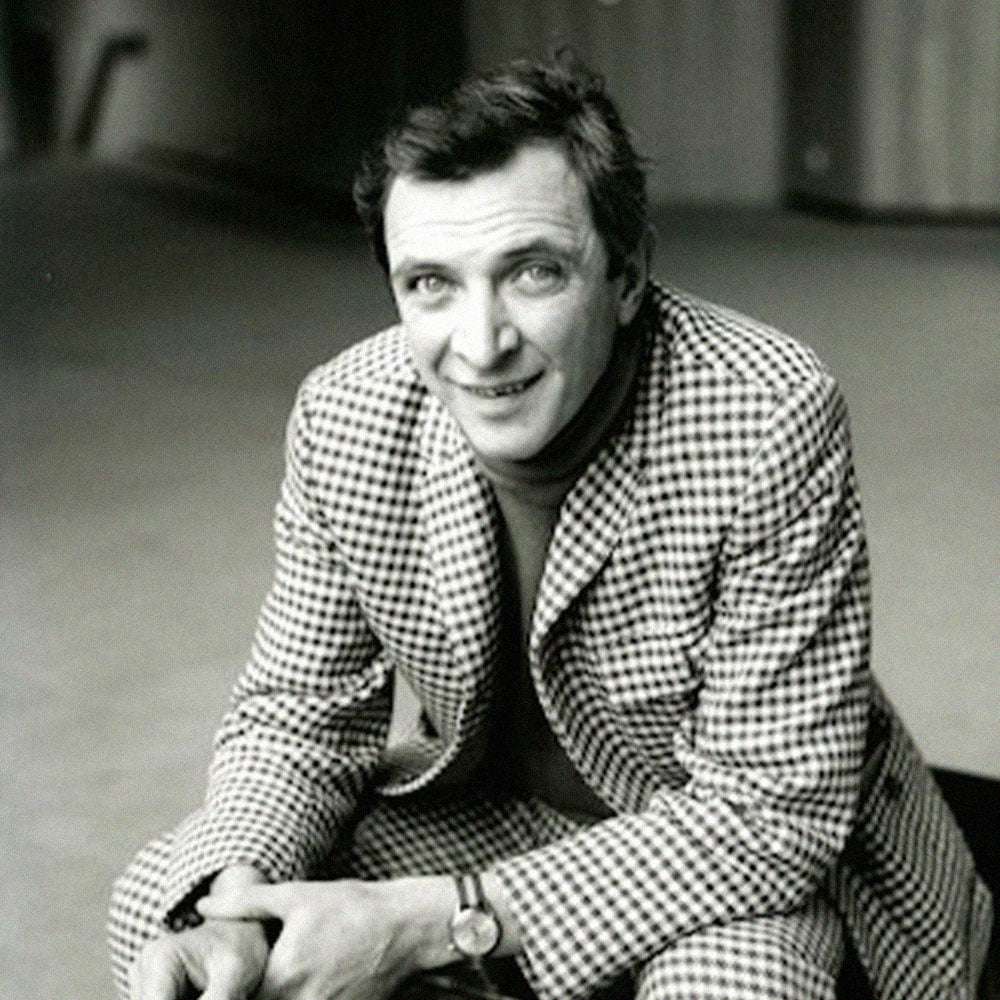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쿠르트-하인츠 슈톨체의 음악 편집
푸시킨 작품의 스토리 전개는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1877년부터 1878년에 걸쳐 작곡, 1879년 모스크바 초연)의 감미롭고도 비극적인 멜로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면마다 자연스럽게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의 음악이 떠오른다. 그러나 크랑코의 발레 <오네긴>에는 오페라의 음악이 단 한 소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드라마적 특징과 본질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점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작품, 특히 <사계>에서 발췌한 곡들이 스토리 전개와 분위기 설정에 절묘하게 기여한 점이 인상적이다. 타티아나와 오네긴의 격정적인 2인무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음악이, 비극적인 분위기는 오페라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음악으로 효과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이는 크랑코가 의도한 안무에 맞게 쿠르트-하인츠 슈톨체(Kurt-Heinz Stolze, 1926~1970)가 심혈을 기울여 편집한 결과물이다.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지휘자인 그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에서 <오네긴>(1965)과 <말괄량이 길들이기>(1969) 등에서 존 크랑코와 긴밀히 협업했다.
정교한 미장센, 드라마투르기, 무대 디자인과 의상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오네긴>은 정교한 미장센으로 관객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낭만적 서사는 웅장한 고전적 스타일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었으며, 판토마임과 독창적인 안무, 특히 아찔할 정도로 극적인 리프트와 흐트러짐 없는 군무 장면들은 갸르니에 극장에 생동감을 더했다.
유명한 타티아나의 편지 장면은 그녀가 거울 속에서 오네긴의 실루엣을 발견하는 꿈으로 변경되었고, 두 사람의 격정적인 사랑은 회전 동작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드라마 발레' 기법으로 탁월하게 재해석한 크랑코의 진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의 심리적 서사 방식은 전후 독일에서는 낯설었던 19세기 고전 발레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크랑코는 이러한 '드라마 발레'를 슈투트가르트에서 정착시킴으로써, 이곳을 독일 발레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뒤이어 그의 후계자인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는 함부르크에서 이 스타일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유려한 선, 화려한 의상, 정교한 무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발레 <오네긴>. 웅장한 무대와 정교한 의상 디자인은 위르겐 로제가 맡았으며, 이는 엄청난 제작비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이후 크랑코의 후예인 노이마이어의 대표적인 대작 발레들의 무대와 의상을 담당했다.
제르멩 루베의 오네긴 역, 복잡한 캐릭터 구현
극 중 오네긴은 강렬한 존재감을 요구하는 어려운 역이다. 이번 무대에서 오네긴 역을 분한 제르맹 루베(Germain Louvet)는 뛰어난 춤의 기교와 감정적 표현의 깊이에 있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오네긴이라는 복잡한 캐릭터 구현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지닌 무용수인 그는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표정 연기로 자만, 무관심, 고통, 그리고 야비함 등을 풍부하게 표현했다.

발레의 본고장이 인정한 수석 무용수 박세은의 타티아나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내로라하는 수석 무용수들이 대거 출연한 이번 <오네긴>에서는, 몇 해 전 인터뷰에서 만났던 박세은이 여주인공 타티아나로 캐스팅(복수 캐스팅)되었다는 점 또한 필자의 흥미를 자극했다.
발레의 본고장에서 당당히 수석 무용수의 타이틀을 달았던 발레리나 박세은에게 필자는 '음악성, 연기력, 신체 조건과 재능 이외에 발레리나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녀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늘 갈고 닦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력을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답했다.

<오네긴>의 여주인공 타티아나 하면 금발에 코가 오뚝한 서양 인형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에 동양 무용수가 타티아나를 연기하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서양인의 뚜렷한 이목구비가 만들어내는 표정의 깊이를 동양 무용수가 재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박세은은 동양 무용수들이 한계로 느낄 수 있는 표정 연기의 벽을, 그녀만의 뛰어난 기량으로 훌륭하게 극복했다. 깃털처럼 가벼운 움직임, 폭넓은 무대 장악력, 그리고 우아한 피루엣은 박세은 고유의 시그니처다.
"애절한 선율을 듣고 있으면, 연기를 한다기보다 음악만으로 스토리와 분위기가 온전히 느껴져서 저절로 몸이 즉각 반응하고 춤이 흘러나옵니다. 안무는 음악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무용수들에게도 악보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박세은은 몇 해 전 인터뷰에서 <오네긴>을 가장 사랑하는 작품으로 꼽았다. 이번 파리 갸르니에 무대에서 박세은은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흐름 속에서 그녀만이 표현할 수 있는 타티아나 해석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마린 칼럼니스트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