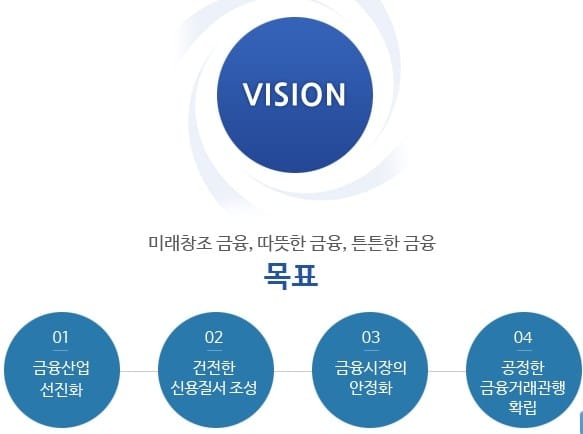
여러모로 따져보면 맞는 말이다.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걸고 들어선 새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내놓았다.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주문했고, 소득양극화 해소방안도 내놓았다. 치매 치료비 국가부담제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화력발전 퇴출방안도 제시했다. 언제 출범했느냐 싶을 정도로 숨가쁜 행보다.
◆금융산업은 스크루지일까
그런데 도무지 금융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금융정책을 어떻게 펼지, 금융정책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지, 금융정책 수장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면위로 알려진 것은 그렇다. 그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토록해 참여정부 시절처럼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간다’거나, ‘금융위원장에 아무아무개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도는 정도다.
할 일이 태산같은 새 정부에서 금융업은 지원부서 정도의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금융은 재정과 함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지금은 아닌 듯 하다. 금융업을 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새 정부에서 드문듯 하다. 그저 실물경제를 지원하거나, 재벌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 정도로 금융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우선은 금융업이, 금융업 종사자들이 그동안 너무 잘못해서 그럴 거다. 그저 재벌들을 위한 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킬 기업을 퇴출시켜야 했는데도,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있는 사람에겐 약하고, 없는 사람에겐 강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스쿠루지처럼 많은 이자를 갈취해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생각도 제법 팽배하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겠지만, 금융업 종사자들이 자초한 결과다.
◆새 정부에 금융업은 수단일뿐?
불행히도 새 정부의 중요 인사들중엔 금융업을 산업으로 보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있는 사람들에겐 과한 부담을, 없는 사람들에겐 약한 부담을’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세금이 대표적이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동산세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게 당국자들의 생각처럼 비쳐진다. 이 돈으로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업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원가가 어쨌든 ‘대기업들에겐 높은 수수료(이자)를, 없는 자영업자들에겐 낮은 수수료(이자)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하다.
그래서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은 없어 보인다. 그저 정부 정책을 지원하거나,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강하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 안목을 가진 사람이!
금융위원장 후보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마찬가지다.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동국대 초빙교수), 김기식 전 국회의원, 홍종학 전 국회의원 등 외부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료출신중에선 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름이 나온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한시적으로 겸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누가 되든 금융업을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반도체 산업에 비견할만한 산업으로 키웠으면 하는게 금융업 종사자들의 바램이다.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듯 자원 하나 나지 않는다. 과연 뭘로 먹고 살 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공무원 더 채용하고, 어린이들 양육비 지급하고, 청년들 취업보조비 주고, 노인들 연금 더 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물론 당장은 남는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 어딘가를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어딘가중 하나가 금융업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이라면 역설적으로 앞으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크지 않을까. 금융업을 어엿한 산업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끝) / hayoung@hankyung.com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