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먼저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 SBS뉴스의 '비디오머그'는 큐레이션 콘텐츠 코너와 함께 실시간 생중계 영상인 ‘비디오머그 라이브’를 제공 중이다.
종편사인 JTBC ‘라이브’ 코너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리포트한다. 최근에는 사회부 기자들이 참여하는 '사회부소셜스토리'가 전기료 '누진세' 논란을 다뤄 화제다. 신문사 중에는 중앙일보가 ‘페북 라이브’를 운영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경제지는 논설위원이 출연하는 영상 뉴스를 서비스한다.
일단 대부분의 언론사의 라이브 영상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유통된다. '페이스북 라이브' 툴을 활용하면 많은 이용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미리 녹화, 편집한 영상을 전하는 것보다 상호작용성도 높다.
디지데이(Digiday)는 지난 5월 뉴욕타임스의 '페이스북 라이브'의 경험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 라이브’ 론칭 이후 전담팀(6명)을 구성해 한 달 간 90건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실험해 그 시사점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자들이 독자댓글에 직접 답해야 한다.(상호작용성) 둘째, 독자를 붙들기 위한 긴장감(재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보도 여부와는 무관하다. 넷째, 공유수 같은 지표 뿐만 아니라 댓글 내용을 함께 판단해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등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라이브 방송 주제다. 뉴욕타임스 의료분쟁 사고를 다룬 엘리자베스 로젠탈(Elisabeth Rosenthal) 기자의 보도, 버즈피드 ‘수박 폭발(watermelon explosion)’ 처럼 반드시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 라이브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 먹히고 있다. 이런 류의 콘텐츠는 독자가 계속 상황을 주시하거나 진행상황 및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상호작용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좋은 댓글을 단 독자와는 가급적이면 기자가 직접 답변을 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엇을 전하는 메시지인가 즉, 아이템도 중요하다. 취재원이 영향력자인가, 평판이 좋은 사람인가, 소셜활동에 적극적인가 등도 한몫 한다.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사업자들은 언론사의 라이브 동영상이 갖는 '파괴력'을 잘 안다. 미국 뉴욕타임스, 허핑턴포스트, 버즈피드 등 '감'이 있는 언론사에게 페이스북은 재정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기성 언론보다는 1인 미디어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비용 대비 효과가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한 지상파방송사는 인터넷전용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짧고 자극적인 비디오 콘텐츠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져서다.
이와 관련 한 종편사 디지털 기획부문 관계자는 "SBS스브스가 의미있는 것은 기존 전통매체에서 젊은이들을 사로 잡는 콘텐츠의 장을 연 것인데 그 이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목적성이 분명하고 세련된 콘텐츠가 갖는 힘"이라고 말한다. 즉, 소셜 독자에게는 완성도 높은 영상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만한 제작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은 함정이다. 점차 시장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영상 제작여건이 충분치 않은 언론사의 딜레마가 이어질 전망이다. (끝) / soon69@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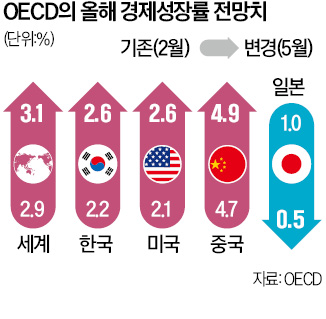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