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지난 3분기 189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합성고무 생산 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 등 사우디아라비아 3개 현장에서 3136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인건비 상승과 하도급 업체 부실에 따른 추가업체 선정, 설계 변경을 둘러싼 발주처와 분쟁, 공기준수를 위한 추가비용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4분기에는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앞서 한화건설도 올해 상반기에만 435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사우디 현장에서 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완공에 앞서 진행하는 시운전 단계에서 발주처와 계약한 수준의 발전 출력이 나오지 않아 추가 공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치솟은 결과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올 들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를 따내겠다는 ‘출혈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사업 수주를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수주만 하면 적자가 불가피한 국내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파트 등 주택사업에서는 높은 인건비 등 사업비 탓에 중견 주택건설업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으니 해외건설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대형 건설사 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건설시장에서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만큼 공정 중간관리를 철저히 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수천억원대 적자가 발생한 한 해외건설 현장의 경우 해외업체에서 납품 받은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지 못해 납품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장의 해외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납품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밝혀봐라’라고 조언해 줬지만 부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업체들은 해외업체들에서 납품받은 주요 플랜트 설비를 연결하는 단순 공정에는 뛰어나지만 주요 설비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7.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연간 해외수주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관리 실패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허울만 좋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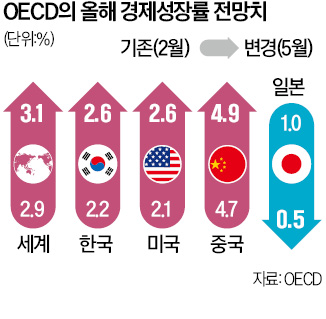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