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랑 통화하신 기자님이시죠? 혹시 기사에 나온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안행부 관계자)
'기재부의 ‘구내식당 입찰’ 변명'이란 본지 기사(9월28일자 A38면)가 나간 뒤 바로 다음날 관련 부처 관계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기재부는 2012년 3월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겠다면서 공공부문 식당 운영에서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시행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혜택을 입은 중소기업은 별로 없었죠.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중견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계 급식기업 아라코 등에 식당운영권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2만명 정도가 상주하는 정부세종청사도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규제를 만든 기재부의 해명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286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 대기업 입찰을 금지하기는 했지만 정부세종청사와 같은 정부기관엔 어떤 규제도 두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에는 대기업 입찰을 금지했지만 ‘정부기관’에는 금지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규제를 실행하는 안행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행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규정을 모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침성 규제를 만든 기재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기도 하고, 부처간 소통이 안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지적을 한 기사를 보고 공무원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누가 ‘발설’했는지, 기사에 나온 기재부 관계자 또는 안행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아마 윗선(국장급)에서 기사에 나온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야 윗선에 보고하기 수월할 테니깐요.
그래서 친한 공무원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부처 또는 다른 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말했으며 당사자인 자신은 이 기사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보고하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귀띔해줬습니다. 그래야 윗선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이날 통화한 공무원 중 한 명은 책임소재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해주니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부처간 업무 협의를 통해 해당 지침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다’ 등의 발전적인 내용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정부를(더 정확히는 공무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늘 겪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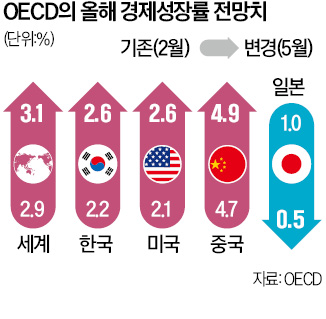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