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38년생)에 이어 신한금융지주 수장에 오른 한동우 회장은 라 전 회장보다 10년 아래인 1948년생입니다. 라 전 회장과 함께 신한은행을 함께 이끌었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을 비롯, 한 회장과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도 모두 1948년 동갑내기입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1951년생이긴하지만 한 회장과 3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10년 주기설’에 대략 들어맞는 리더지요. 서 행장도 차기 신한금융 회장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신한은행장 후보로 58년생 3인방(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성락 신한생명 사장·김형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신한맨들 사이에서는 10년 주기 권력 교체설을 웃어 넘기기도 곤란할 지경입니다. 신한을 이끌 걸출한 리더들이 10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라 전 회장이 1991년 신한은행장에 오른 뒤 20년이 넘게 행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치며 자리를 지킨 탓도 있지만 다른 금융 지주사에 비해 신한의 권력 교체 주기는 긴 편입니다. 신한의 속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물이 수장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황영기·어윤대·임영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하산’들이 회장직을 맡았던 KB금융지주 등과도 대비됩니다.
일각에선 신한금융지주가 오늘날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 긴 권력주기에 기반한 조직안정성을 꼽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의 얼굴도 바뀌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집권이 낫다는 것이죠. 금융권 관계자들이 “금융에 있어서 조직안전성은 곧 경영안전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장기 사업에 있어서의 일관성 유지 등 장점이 많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노력하면 CEO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조직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 전 회장이 한 때는 신임하던 후배였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과의 갈등 끝에 ‘신한사태’를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과정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라 전 회장은 물론 최근 ‘김종준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퇴임 후에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죠. 권력 사유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장기 집권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어쨌거나 지난해 신한은행에 입행한 1988년생 신입행원은 10년 주기 권력 교체설에 대해 “계속 이어져야 할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말하고 웃습니다. 이 행원의 야심찬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우선 한 회장 다음의 권력 승계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사태’의 교훈을 새기고 정당한 권력 승계 프로세스를 밟아갈 수 있을지 신한금융지주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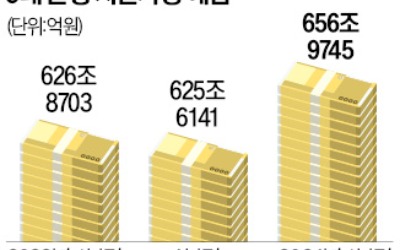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